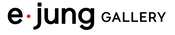김이수 초대전
시간과 공간의 경계선 너머
바다의 수평선, 하늘의 석양을 보았다. 넓은 하늘과 수평선, 붉은 노을과 수평선,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풍경! 저 아득한 수평선을 감싸고 요동하는 노을. 수평선은 바다와 하늘을 가르는 공간의 경계선이요, 석양은 빛과 바람을 삼키는 시간의 경계선이다. 그 경계선에 나는 서 있다. 시간이 흐른다. 시시각각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공기와 빛의 파장, 나는 그 경이의 풍경을 붙잡는다. 공기와 빛은 바스러져 수평선으로 밀려 들어간다. 시간과 공간의 경계선 너머로 잘게 갈라지는 풍경 속의 풍경! 그 미세한 ‘차이의 풍경’을 본다.
나는 이 ‘차이의 풍경’에 마르셀 뒤샹이 제시한 앵프라맹스(inframince)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. 앵프라맹스는 아주 얇고 아주 작다는 의미이다. 그것은 완벽한 실체가 없는 것,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과 그 가장자리를 설명할 때 적용된다. 복잡하면서도 불완전한 개념이다. 미술의 경우, 미세한 선들을 ‘두께’(an 'eppaisseur')로 지시하기도 하고, 선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.
나의 ‘앵프라맹스-풍경’은 석양의 시간과 수평선의 공간,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그 경계에 서 있다. 나는 이 세상에서 똑 같은 풍경을 두 번 본 적이 없다. 그 경계의 풍경과 만나는 내 기억의 저장고는 언제나 진행형이다.
바다의 수평선, 하늘의 석양을 보았다. 넓은 하늘과 수평선, 붉은 노을과 수평선,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풍경! 저 아득한 수평선을 감싸고 요동하는 노을. 수평선은 바다와 하늘을 가르는 공간의 경계선이요, 석양은 빛과 바람을 삼키는 시간의 경계선이다. 그 경계선에 나는 서 있다. 시간이 흐른다. 시시각각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공기와 빛의 파장, 나는 그 경이의 풍경을 붙잡는다. 공기와 빛은 바스러져 수평선으로 밀려 들어간다. 시간과 공간의 경계선 너머로 잘게 갈라지는 풍경 속의 풍경! 그 미세한 ‘차이의 풍경’을 본다.
나는 이 ‘차이의 풍경’에 마르셀 뒤샹이 제시한 앵프라맹스(inframince)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. 앵프라맹스는 아주 얇고 아주 작다는 의미이다. 그것은 완벽한 실체가 없는 것,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과 그 가장자리를 설명할 때 적용된다. 복잡하면서도 불완전한 개념이다. 미술의 경우, 미세한 선들을 ‘두께’(an 'eppaisseur')로 지시하기도 하고, 선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.
나의 ‘앵프라맹스-풍경’은 석양의 시간과 수평선의 공간,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그 경계에 서 있다. 나는 이 세상에서 똑 같은 풍경을 두 번 본 적이 없다. 그 경계의 풍경과 만나는 내 기억의 저장고는 언제나 진행형이다.